
“엄마, 어느 고등학교를 갈지 고민이야.”
아직 중학교 2학년인 큰 아이, 벌써(?) 진학이 고민인가 보다.
누가 들으면 선택할 고등학교가 무척 많은가보다 하겠지만, 사실 인구 4만명(인구 4만명이라는 규모는 굳이 비교하자면 내가 나고 자란 서울 강서구 발산제1동 인구와 맞먹는 수준의 것이다)도 채 되지 않는 함양군에서 갈 수 있는 학교는 몇 되지 않는다.
우선 함양읍내에 소위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가 각 1개씩 있다. 차로 2~30분 떨어진 면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1개 더 있고, 더 골짜기로 들어가면 다른 면 지역에도 고등학교가 있지만 읍내 아이들의 선택지에 그 고등학교가 들어가지는 않는 듯하다. 물론 함양에서 공부를 아주 잘한다는 아이들은 인근 거창군에 있는 몇몇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기도 한다. 드물지만 조금 멀어도 기숙사가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나 공립형 대안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다.
아이의 입에서 “A 고등학교를 갈까 봐” 하는 말이 떨어지자, 그제서야 나는 ‘아차’ 싶다. A 고등학교를 다니는 내 아이의 모습을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산청에 있는 대안학교는 어때? 물론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혁신적인 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다는데 말이야...’
‘고등학교를 꼭 가야하는 건 아니잖아? ’갭 이어‘라는 제도가 한국에도 있으니...’
당황하여 맥락도 없이 이야기를 주절거리는 나에게 아이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꾸한다.
“엄마, 나 대안학교는 별로야. 그리고 고등학교 가고 싶어.”
8년 전 아이들과 함양으로 이주했을 땐 막연하게 내 아이들과 친구들이 ‘잘 놀기’를 바랐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런 시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학부모활동으로 함양에서의 지역활동을 시작했다.(사실 본격적으로 활동에 불을 붙여주신 분은 당시 경상남도지사를 하고 있던 ‘홍 모’ 님이다. 감사하는 마음,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내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나는 내 아이가 승자독식의 열차에서 내려서기를 바라는 ‘비주류’ 부모의 막연한 자기 욕심(?)만 있을 뿐,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고백컨대, 나에게는 답이 없다.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러쉬, 진학 그 이후의 삶...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면 어떻게 될까? 좋은 직장을 가진 뒤에는? 아무것도 내 안에 명쾌한 답이 없다. 그러니 엄마인 나는 입 닥치고 아이의 선택에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불안’의 마음을 ‘응원’과 ‘사랑’으로 바꾸어야 한다. 내가 있어서, 우리가 있어서 그 곳이 좋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되니까.
변방으로 이주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살아가는 곳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다. 나 또한 그곳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 문제 안에 내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다. 언제까지 ‘서울은 안 그래요.’ ‘부산은 말이야...’ 하면서 이곳의 일을 남의 일로 치부해버릴 수는 없으니. 나는 이제 ‘여기’에 있기에. 여기서 꽃밭을 일구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변방’은 진정한 ‘로컬’이 된다. 순간순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이의 진학으로 다시 곱씹는다.
그러니 얘야, 너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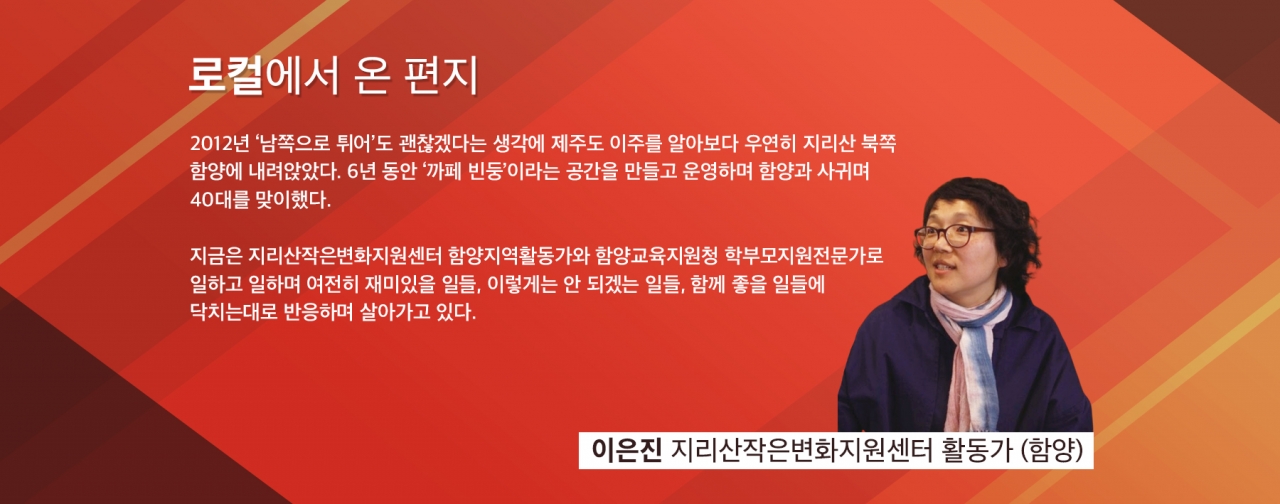
- [로컬에서 온 편지] 3. 서울 친구에게 부치는 편지
- [로컬에서 온 편지] 2. 지역 청년을 보는 다른 시선
- [로컬에서 온 편지] 1. 고향 여행 중입니다
- 이로운넷을 풍성하게 할 새 필진을 소개합니다.
- “14살 창업가 테일러처럼~” 청소년 창업축제 ‘비즈쿨 페스티벌’
- 어르신 큐레이터가 전시기획부터 해설까지!
- [로컬의 미래⑬]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옥천서 '재밌는 일' 벌입니다"
- [로컬의 미래⑫] 서울서 고향으로 '유턴'한 도시계획가 "살맛나는 지역 공동체 만들어요"
- [로컬의 미래⑪] “연대의 기본은 신뢰, 협력으로 지역문제 해결합니다”
- [로컬의 미래⑩] “25세 정착한 ‘괴산’, 조용하고 자극없는 분위기에 푹 빠졌죠”
- [손종수의 생각의 풍경] 독보건곤의 바둑 풍운아 이세돌이 떠났다
- [윤명숙의 화톳불 옆 소소담담] 4. 기억 속의 학교, 골목, 그리고 여관
- [로컬에서 온 편지] 5. 서울 밖에는 꿈이 없다
- [로컬에서 온 편지] 7. 청년을 환대하는 지역, 지역을 살리는 청년
- [신년기획Ⅱ- 전문가에게 듣다] ⑦임경수 “대숲의 이야기를 듣자”
- [로컬에서 온 편지] 8. 무엇이 약자를 약자로 만드는가
- [로컬에서 온 편지] 9. 까페 빈둥
- [로컬에서 온 편지] 10. 지방에서 돈 벌고 싶은 당신에게
- [로컬에서 온 편지] 11. 사진 찍는 아빠와 글 쓰는 딸의 소집
- [로컬에서 온 편지] 12. 지역, 찾아오는 청년 떠나는 청년
- [로컬에서 온 편지] 13. 다시 만난 세계
- [로컬에서 온 편지] 14. 코로나 단상
- [로컬에서 온 편지] 15. 지방에서 언제 사라져도 모를 스타트업이 만난 코로나19
- [로컬에서 온 편지] 16. 프리랜서와 소상공인 그 사이에서
- [로컬에서 온 편지] 17. 코로나19 시대, 마을 공동체의 의미?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연대하기!
- [로컬에서 온 편지] 18. 코로나 시대의 서울행
- [로컬에서 온 편지] 19. 빈둥 한국어 교실
- [로컬에서 온 편지] 20. 지방 소도시에서 실패하지 않는 방법
- [로컬에서 온 편지] 21. 지누아리를 찾아서
- [로컬에서 온 편지] 23. 지도를 그리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 [로컬에서 온 편지] 22. 연결의 가능성 - '컨택트'에서 '커넥트'로
- [로컬에서 온 편지] 24. 학부모를 돕는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