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유감입니다. 지방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올라왔다가 그만 중지를 하게 되어 경성에 있는 여러 운동단체보다도 한층 더 미안합니다. 이번 대회에 중지된 것으로 말하면 순전히 지방열 때문입니다. (중략) 체육회의 부덕한 소치라고 하겠지요.”
조선체육회 고원훈 이사장이 제1회 전조선축구대회에 남긴 총평이다. 청년부 배재구락부(경성)와 숭실구락부(평양) 시합 중 발생한 판정시비로 대회가 중단됐고 뒤이은 모든 경기도 열리지 못했다. 고원훈 이사장은 국내 첫 축구대회의 파행 이유를 ‘지방열’ 때문이라고 규정지었다.
“1930년대는 지금 돌이켜 보아도 부러울 만큼 축구열이 대단했다. 당시는 서울, 평양 등 도시보다 지방이 더 극성을 부렸다. 중소도시라면 으레 그 지방을 대표하는 축구팀이 있었고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1년에 한 두 차례 대회를 치르는 게 관례였다.”
올 3월 타계한 박경호 축구원로(1956 제1회 아시안컵 우승멤버)의 회고다. 이렇게 한국축구의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축구 팬은 국가대표팀 경기에만 관심을 갖고 K리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외국 축구기자의 지적이 의문이다. K리그 참가팀은 앞서 언급한 도시, 지방을 대표하는 팀이기 때문이다. 그 많던 지방축구열은 누가 다 팔아 먹었을까?
전쟁, 내전으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되면 대체로 3대에 이르러 다시 만들어진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전국 각지의 피란민이 부산에 정착했다. 피란민의 아들딸은 서로 허물없이 어울렸지만 내 아빠와 엄마는 늘 고향을 그리워했고 친구의 엄마 아빠도 그랬다. 사연없는 이가 없었다. 통한의 인생이 한으로 사무친 이들이 떠나고 이제 그 손자들이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손자들은 부모도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 친구의 엄마 아빠도 대개 다 부산사람이다.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카더라.

한국축구도 현대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대표팀의 축구와 K리그의 축구가 다르지 않다. 똑같은 축구인데 국가대표팀만 관심을 끄는 현상에 답하려면 축구 밖에서 현대사를 큰 맥락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간의 한국 현대사는 연고 도시(지역, 지방)에 투영할 정체성이 와해된 채 국가단위 정체성만 가졌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공동체가 다시 만들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 요 근래 로컬이란 단어를 심심찮게 접하는 이유고 축구 팬들이 “K리그가 부쩍 재밌어 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다. 실제로 2019 시즌 K리그1은 한 해 전보다 47.2%나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으며 높아진 지역축구 열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프로축구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다. 우리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는 프로축구팀(지역팀)에 애정을 갖고 정체성을 투영할 만큼 자의식이 높고, 깊어졌다.
이런 K리그가 분기점에 서 있다. 지방열이 회복될 만큼 시간이 흘렀지만 동시에 지방소멸이 사회적 화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 그리고 지방은 서울의 심리적 식민지다. 입시가 이를 제도로 뒷받침했다. 소위 ‘인서울’이란 굴레 아래 서울을 성공한 자들의 공간으로 그 외 다른 지역은 실패한 자들의 공간으로 인식하며 우리는 성인이 됐다. 고작 대학입시라는 인생 한 순간의 평가가 도시와 국토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20대와 30대는 교육과 직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긴다.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간 20대 비율이 2000년대 11.45%에서 2010년대 24.35%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비율도 10여년 만에 배에 달했다. 심리적 종속과 생활여건의 압도적 편중. 식민지라는 표현이 과한가 싶지만 식민(植民)이 별다른 뜻이 아니다. 사람을 옮겨 심는 게 식민이다.
도시가, 지역이 소멸하면 지역의 프로축구팀이 존재할 수 없다. 포항이, 전주가, 울산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축구팀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지방소멸은 곧 K리그의 소멸과 같은 말이다.

지방도시들이 사라진 서울공화국의 K리그에선 FC서울과 서울이랜드만 남는다. 올 시즌 K리그1에 참가한 FC서울은 강등권을 전전하며 부진했다. 명문구단의 자존심에 상처로 남을 2021 시즌. 서울공화국의 K리그에서는 강등 걱정이 없다. 두 팀밖에 없으니까. 못해도 준우승! 두 팀이 사이좋게 트로피 주고받으면 된다.
한국축구는 대한민국 그 자체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대표팀을 꾸릴 실력이 있어도 국가가 없어 일본 외지(外地) 대표로 일본대회에 출전했다. 체제경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축구가 반공의 도구로 쓰였고 우민화 정책 3S 일환으로 프로축구가 탄생했다. 2002 한일월드컵은 대한민국이 세계 문화체육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었다. 축구에는 늘 시대가 스며 있었다. 그렇다면 각 지역이 소멸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한국축구, K리그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광고 제작자 이제석씨는 신대한민국전도를 통해 “지역이 발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든다”라고 강조한다. 그의 주장을 빌리면 지역 축구팀이 발전해야 더 큰 K리그를 만들 수 있다. 한국축구가 “지금 돌이켜봐도 부러울 만큼 지방의 축구열이 대단했다.”라는 축구원로의 회고를 재현해 낼 수 있을지는, 지방열 회복과 지방소멸의 분기점에 서 있는 한국사회가 어디로 나아가는지에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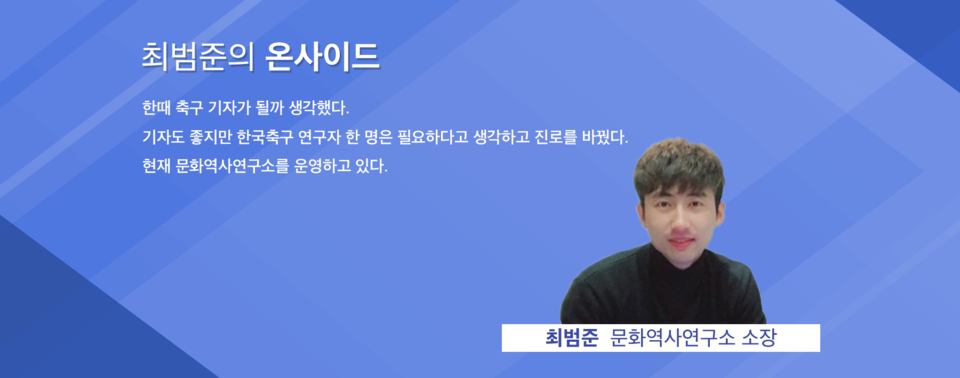
- [최범준의 온사이드] 20. 한국사회의 오래된 미래, 그리고 축구
- [최범준의 온사이드] 19. 여기에 한국축구의 K웸블리가 있다
- [최범준의 온사이드] 18. 한국축구 재도약을 위한 한 가지 방법
- [최범준의 온사이드] 17. 누명(陋名), 어느 축구대회의 변론
- [최범준의 온사이드] 16. 한국축구, 별안간 프로의 시대를 맞이하다
- [최범준의 온사이드] 15. 1970년대, 정부주도 축구 중흥을 이끈 한 남자
- [이로운BOOK촌] 월드 스타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다면?
- [최범준의 온사이드] 22. 한국축구 첫 A매치가 정부수립 전에 열린 이유
- [최범준의 온사이드] 23. 골 때리는 그녀들을 만든 어느 축구대부 이야기
- [최범준의 온사이드] 24. 축구대회 FA컵을 통해 구현되는 스포츠기본법
- [최범준의 온사이드] 25. 한국사회를 비추는 거울, 한국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