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을 잃어간다. 점점 말이 싫어진다. 타고나길 말 많은 성격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아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사람이, 너무 말이 없어’라는 소릴 종종 듣는 편인데 이제는 생계를 위해 꼭 해야 하는 말이 아니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산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말, 수사만 요란하고 알맹이 없는 말의 성찬이 범람하는 시대도 견디기 어려운데 요즘은 이악스러운 정치, 언론인들의 막말까지 뒤섞여 바다 건너 열도까지 내왕하며 속을 긁어대는 바람에 하루하루 사는 일이 혼미할 지경이다.
이틀 전 황망한 소식을 들었다. 문학의 연으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의 부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장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약한 몸이었으나 그렇다고 병치레가 잦았던 것도 아니고 그런 징후를 보인 적도 없는데 갑자기 페이스북에 ‘멀쩡하던 제 아내가 급성 질환으로 방금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경황이 없어 일일이 알리지 못해 여기에 올립니다.’란 글을 올려둔 것을 보았다.
때마침 바쁜 날이어서 볼 일과 볼 일 사이의 몇 시간을 쪼개 겨우 빈소에 다녀왔다. 고인을 향해 애도를 표하고 맞절한 뒤 일어선 친구의 얼굴을 보니 울컥, 목이 메어와 어떤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다. 그저 손을 맞잡고 잠시 울먹임에 가까운 침묵으로 황망한 이별의 서러움을 나눴을 뿐.
부부란, 서로 소중한 반려(伴侶)겠으나 그의 부인은 그 이상의 특별한 동반자였다. 영문과 교수이면서 시인이자 평론가인 친구는 짝을 찾기 어려운 ‘일 중독자’라 짧은 시기에 꽤 많은 저작을 쏟아냈는데 그 모든 원고를 함께 읽고 평하며 마감의 취사선택을 결정해준 조언자가 바로 부인이었다. 80년대 불의한 정권에, 노래로써 저항한 ‘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일원이기도 했던 부인은 친구의 동료, 선후배, 제자들까지 친애하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로 온화한 사람이었다.
그는 결혼 이후 강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부인과 함께 보냈다고 한다. 휴가나 여행은 물론, 집필을 위해 교외의 은신처로 떠날 때조차 부인과 동행했다. 그야말로 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익조(比翼鳥)와 연리지(連理枝) 같은 존재였던 것인데.
“집사람은 서울에서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고 나는 춘천에서 강의가 잡혀 나중에 홍천(집필실이 있는 곳)으로 오기로 했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카톡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 거야.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거든. 미친 듯이 차를 몰아 집으로 갔지.”
부인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 나중에 밝혀진 부인의 사망 추정시간은 친구가 전화를 걸기 이전이었다. 다른 이들로부터, 친구가 차갑게 식은 부인을 안고 짐승처럼 울었다는 말을 들었다. 왜 그러지 않았겠나.
내게도 그런 기억이 있다. 단 한 명뿐인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그 황망한 기억. 임종도 하지 못하고 뒤늦게 도착해 얼어버린 나무토막 같은 손을 움켜쥔 채 어떤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쏟던 기억.
그때의 기억이 겹쳐 묵묵히 친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다. 온갖 위로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어떤 말도 제대로 건네지 못했다. 고작, 빈소에서 친구와 맞절을 하고 난 뒤 두 눈이 축축해진 친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어.’라고 했던가.
약속시간에 맞춰 일어나 따라 나온 친구의 손을 붙잡고서도 끝내 위로의 말은 건네지 못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다. 왜 나는 따듯한 말 한 마디 전하지 못했나. 후회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막연하지만, 알게 됐다. 어떤 말은 입 밖으로 발화하는 순간 진실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어떤 위로는 말에 담는 게 아니라 조심스러운 침묵의 표정에 담아 건네야 한다는 것을. 빈말의 허사가 싫어 끝내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이런 글을 남기게 됐지만.
말을 잃어간다. 점점 말이 싫어진다. 타고나길 말 많은 성격이 아니어서 그러지 않아도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사람이, 너무 말이 없어’라는 소릴 종종 듣는 편인데 이제는 생계를 위해 꼭 해야 하는 말이 아니면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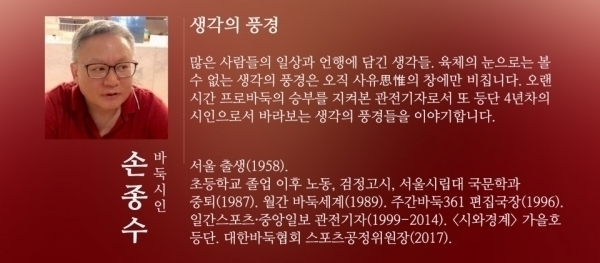
- [알면 the 이로운 금융] 7. 은행, 백배 활용하기
- [창사11주년] 희망을 찾는 방법
- [알면 the 이로운 법] 7. 사업 아이디어와 정보를 도용 당했을 때 대처방법
- [알면 the 이로운 건강] 14. “마음의 병,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 [김재춘의 사회혁신 솔루션] 11. 쇼핑이 투표보다 더 중요하다?
- [이강백의 공정무역 이야기] 끝. 우리가 공정무역을 하는 이유?
- [이정재의 단필단상(短筆斷想)] 5.개미들은 모두 열심히 일할까?
- [도현명의 임팩트비즈니스리뷰] 7. 스웨덴에서 만난 소셜벤처의 미래
- [김우재의 과학적 사회] 5. 블랙 팬더와 과학자의 정치
- [박승호의 일상다반사] 13. 당신에게는 얼마나 많은 [ㅤㅤ]가 필요한가?
- [손종수의 생각의 풍경] 이런 말 저런 생각 그리고 반성문
- “도대체 시인은 왜 돈도 안 되는 시를 쓸까?”에 대한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