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있는 이유가 네 태도 때문이란 생각 안 해보니?”
얼마 전 하지 않으면 더 좋았을 말을 동생에게 던지고 말았다. 그날 나는 짧은 일정으로 해외 출장 중이었고, 시간에 늦지 않게 회의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다.
“오빠, 엄마 카톡 계정 뭐로 되어 있어요??”
내가 미처 메시지 확인을 못 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 동생이 다시 메시지를 보내왔다.
“됐어요. 직접 계정 찾기 했어요. 구글로 다 되어 있구나? 그대로 유지해주세요.”

‘그대로 유지해주세요’라는 말이 명령조로 들리면서 갑자기 꼭지가 돌았다. 지난 이십여년간 내가 관리해오던 것들이었다. 컴퓨터가 고장 나면 고치고 노후하면 교체하기도 하고, 메일이나 글쓰기 환경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율했다. 그런데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가보면 비밀번호 멋대로 바뀌어있고, 환경설정이 낯선 모습을 하고 있으면 그때마다 짜증이 났다. 변화가 생길 때마다 공유되어야 하는 일인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관리는 한 사람이 도맡아야 한다.
“갑툭튀가 얼마나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지 아니? 내가 참다 참다 한마디 하겠는데, 휘젓고 다니지 마. 아주 불편해져.” 최악의 말을 끌어내는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그리고는 결국 오랫동안 후회할 말을 내뱉고 만 것이다. 여러 해 꾹꾹 참아왔으니 한 번 더 목구멍으로 삼켜 넣었으면 좋은 일이었다.
사실 내가 힘들었던 것은 괜한 자격지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학업을 마치기 전 결혼을 비교적 일찍 한 탓에 부모님 댁에서 더부살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3년 뒤 직장 때문에 낙성대로 이사하여서 살았던 2년을 제외하면 나는 평생을 부모님 댁 반경 1㎞ 이내에서 어슬렁거렸다. 부모님이 연로하시면서는 그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지난 20년은 같은 아파트에서 층만 달리하며 살았다. 그러다 작년에 두 집을 정리하고 한지붕 아래에서 살게 된 것이다. 결혼 30년만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때로는 모시고 사는 느낌이었다가 때로는 얹혀사는 느낌으로, 그래서 부모님이나 우리 부부나 서로에게 격식도 없고 자유분방하다. 서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고마운 관계같은 건데, 이게 평소에는 전혀 못 느끼다가 긴 여행 등으로 오래 집을 비우게되면 그제서야 빈자리가 드러난달까.
반면 가끔 찾아오는 형제들의 방문은 그 자체가 돋보인다. 우리가 하면 일상이지만 간만에 온 이들이 하면 뭔가 이벤트가 되는 격이다. 우리는 공기같은 존재여서 실재하지만 느껴지지 않았다. 반면 산소같은 존재들은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에 톡톡 터지는 탄산수의 기포처럼 보이는 신선함을 제공했다. 일상과 가끔의 차이는 이렇게 명징하게 나뉘었다. 일을 나눌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더 자주 찾아와서 일을 좀 나누며, 탁한 공기에 산소를 공급하여 전체 공기의 질이 좋아지면 좋을 일이었다. 하지만 응급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워버리면 방안 전체의 공기 질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 산소가 하는 일이 희안하게 안해도 될 일을 더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 뒷처리는 온전히 나의 담당이었다. 그게 쌓이고 쌓이다가 이날 터진 것이었다.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했다면 저렇게 심한 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판을 통해 오가는 메시지의 말들은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 간의 소통이다. 동생은 집에서 엄마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한다며 낑낑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 시간 나는 출장중 무거운 짐을 끌고 이동 중이었다. 서로의 모습은 읽히지 않고 오직 자신이 처한 상황들만 머릿속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감정은 더 격해지기 쉬웠다. 메시지를 읽지 않거나 읽고도 무시해버렸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물은 이미 엎질러 버렸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냥 덮어지는 실수들도 있다. 하지만 어떤 실수들은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기도 한다. 메시지로 전달되는 말은 잘 벼린 양날 검이다. 빠르고 쉽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기도 하지만, 그 말에 흉기를 담기도 쉽다. 때때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의 업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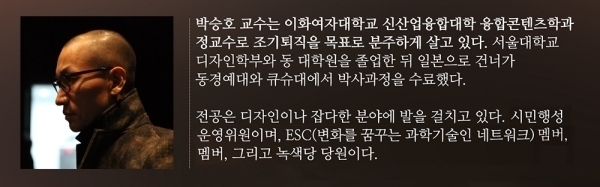
- [알면 the 이로운 역사]⑤100년전, 파리강화회의 한국대표단의 미션
- [알면 the 이로운 금융] 3. 개인 신용등급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 [김재춘의 사회혁신 솔루션] 7. 사회변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
- [손종수의 생각의 풍경] 영화 ‘가버나움’이 불편한 이유
- [알면 the 이로운 건강] 6. 치아의 모든 면을 꼼꼼히 닦는 것이 잇솔질의 핵심
-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8. 스스로를 구원하며 살아가기
- [도현명의 임팩트비즈니스리뷰] 3. 소셜벤처, 안전한 경로라는 함정
- [김우재의 과학적 사회] 1. 유네스코의 이름을 바꾼 생화학자
- [손종수의 생각의 풍경] 시인의 거짓말
- ‘그 좋은 직장’ 관두고, ‘설명 필요한 삶’을 택한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