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에 한 번 기고하는 글의 차례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소중한 지면을 내준 분들께는 염치없고 죄송한 말씀인데 그만큼 숨 가쁜 나날을 보냈다는 뜻이다.
경기도 김포로, 강원도 영월로 단풍잎 휘날리며 달려가 글쓰기강의를 하고 강원도 죽변에 가서 중장비를 운전하는 노동자시인을 만나 밥 한잔 나누고 왔다.
또 대구 키다리갤러리에서 신성(神聖)이 담긴 다육소녀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개인전에 다녀왔고 시인들과 독자들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문학저변 넓히기 행사 <詩장사람들>에 참여해 시집과 시인이 만든 대추나무목걸이를 팔았다.
더 있다. 잘 만든 정선아리랑 노래극 <여자의 일생>을 앙코르공연까지 두 번 관람했고 춘천 ‘샘밭의 철학자’로 불리는 시인친구의 북콘서트에 다녀왔다.
누군가 물었다. 바삐 사니 좋아 보이긴 하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사나? 그럼, 밥 굶을까봐? 그 정도 재주는 있는 사람이야 하고는 피식 웃었지만 사실, 이 한 달은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다.
좋아서 하는 일이라지만, 16년을 이어온 생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겠다는 낙하산 대표를 상대로 협상을 벌여 1년의 재활지원 급여를 받아낸 처지가 아니었다면 진즉, 길거리로 나앉았어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동안 시는, 가난과 불우를 품어야 마땅한 예술이라는 기특하고도 아둔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터라 자괴감 따위는 생각의 주변에 얼씬거리기조차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본 발레리나의 인터뷰 하나가 속을 긁었다.
13년 만에 전막 발레로 내한한다는 ‘세기의 발레 여신’ 스베틀라나 자하로바가 “한국은 무용 팬이 많지 않고 전통무용에 관한 관심도 미미한데, 러시아에서는 발레가 ‘국민예술’이라죠?”라는 인터뷰어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글쎄요, 발레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순수예술이자 엘리트예술이죠. 그러나 그것이 발레의 매력입니다. 발레는 앞으로도 대중예술은 될 수 없어요. 특정한 문화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면서 일상을 잊고 미적인 쾌감을 느끼는 예술이죠. 예전부터 그래왔고, 우리 시대에도, 미래에도 그럴 거예요.” - 중앙SUNDAY <S> 발췌
한 분야의 정점에 선 예술가의 사견에 가타부타 시비를 걸 생각은 없고 불현듯 몰락의 기로에 선 이 나라의 문학과 그 중에서도 명맥이 위태로운 시의 현실이 떠올랐다.
이름이 알려진 시인들이 시집을 출간하면 수십만 부씩 팔려나가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도대체 문학은, 시는 언제부터 바람 부는 벼랑에 서게 된 것일까.
혹시, 이 나라의 시단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학계와 출판계의 권력자들은 자하로바의 말처럼 시를, ‘특정한 문화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시집을 펼쳐들고 새로운 세계에 빠져들면서 일상을 잊고 미적인 쾌감을 맛보는 예술’로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
그리하여 시집 한 권에 십만 원쯤 받고 시인들의 콘서트 입장료를 기십만 원씩 내야 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름을 떼면 도무지 누구의 시인지 알 수 없이 비슷비슷한 몰개성의 신춘문예 시인들을 양산하고 책 좀 읽는다는 독자들조차 ‘요즘 시들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서 시집 안 사본 지 꽤 됐어요.’라는 말을 하게 만드는 건가.
시는 설명하면 진부해진다. 그냥 느껴야 하는 장르다. 가장 흔한, 시인의 변(辯)이다. 메타포(은유)가 시의 요소라는 건 안다. 시를 가르치는 선생에게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가르친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소월과 영랑과 백석이 나오면 안 되는 건가? 노랫말로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운 서정을 쓰는 시인은 과거에만 존재해야 하는 건가. 시의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감동받고 위로와 치유의 예술도 되는 거 아닌가. 시 좀 쉽게 씁시다, 그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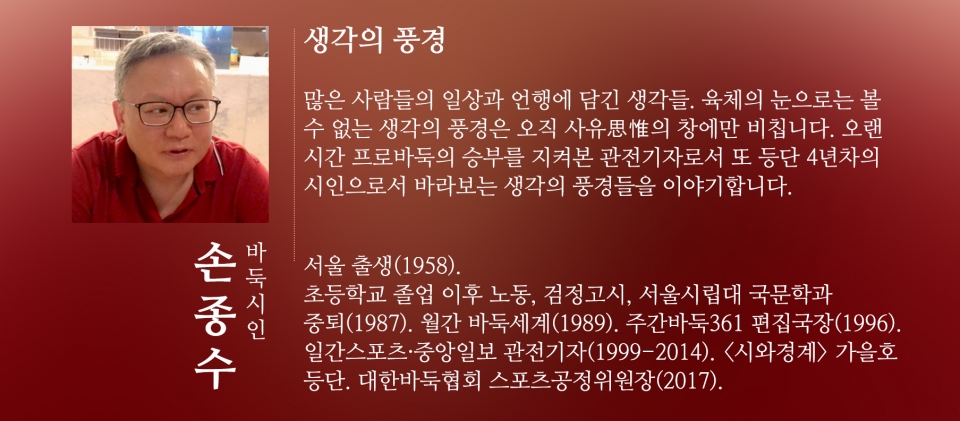
- [손종수의 생각의풍경] 소통과 공감의 미덕 ‘복기(復棋)’
- [손종수의 생각의풍경] 버럭 씨의 달나라 여행기
- [기자수첩]워치 심전도측정이 불법인 나라가 4차산업혁명을?
- [김재춘의 사회혁신 솔루션] 3. ‘문제 해결 생태계’에 새로움?다양성이 필요하다
- [기고] 복잡한 사회문제, 새로운 방식으로 해법 찾는 ‘캐나다 사회적금융’
-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3. 제주의 잠 못드는 밤 -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 올 사회적경제기업 크라우드펀딩 11억 돌파…2017년比 6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종관 씨 위촉
- [손종수의 생각의풍경]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라면의 인문학
- [사회적경제, 통일한국 대안될 수 있나] 1. 북한도 미래지향적 일자리 갖춘 살만한 도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