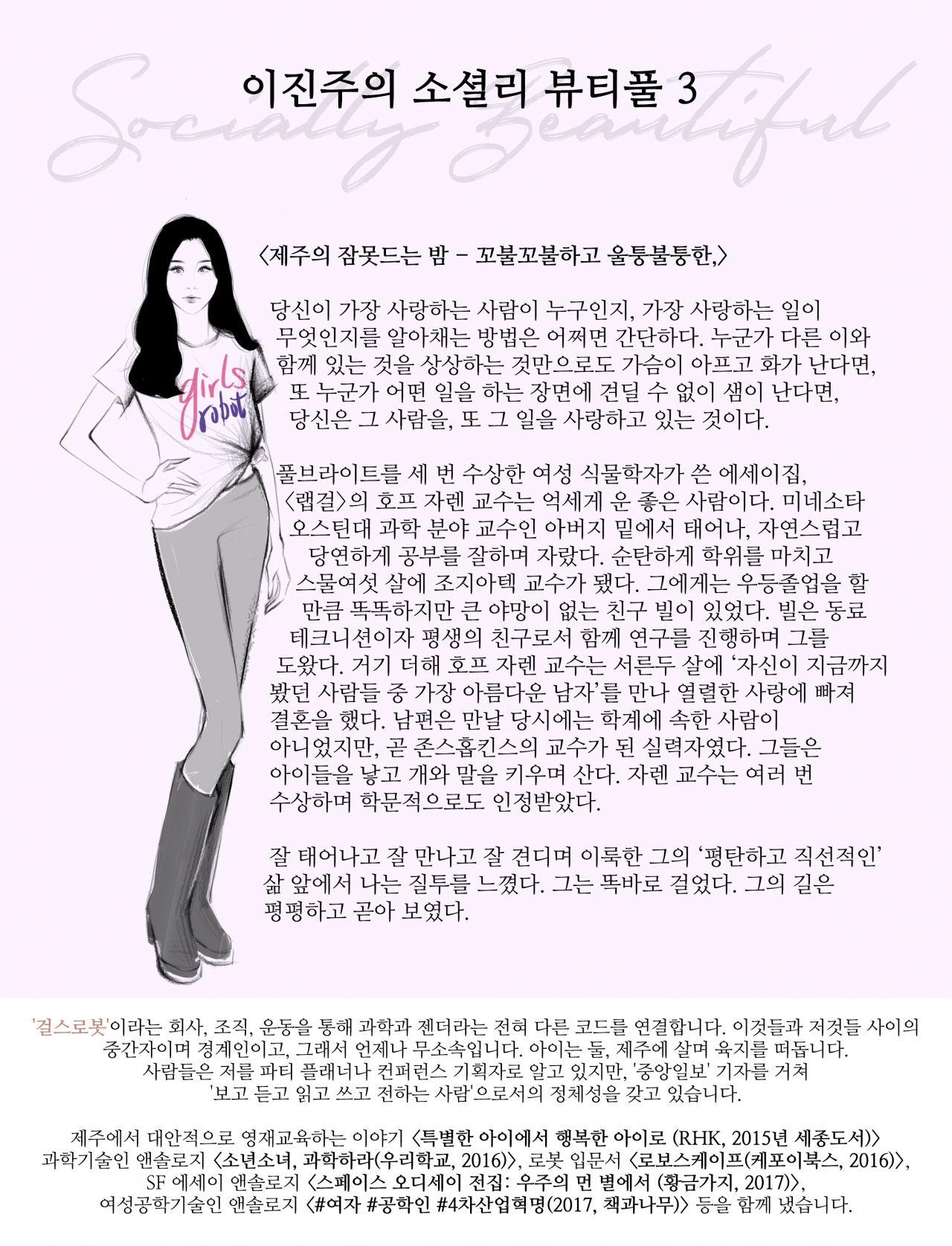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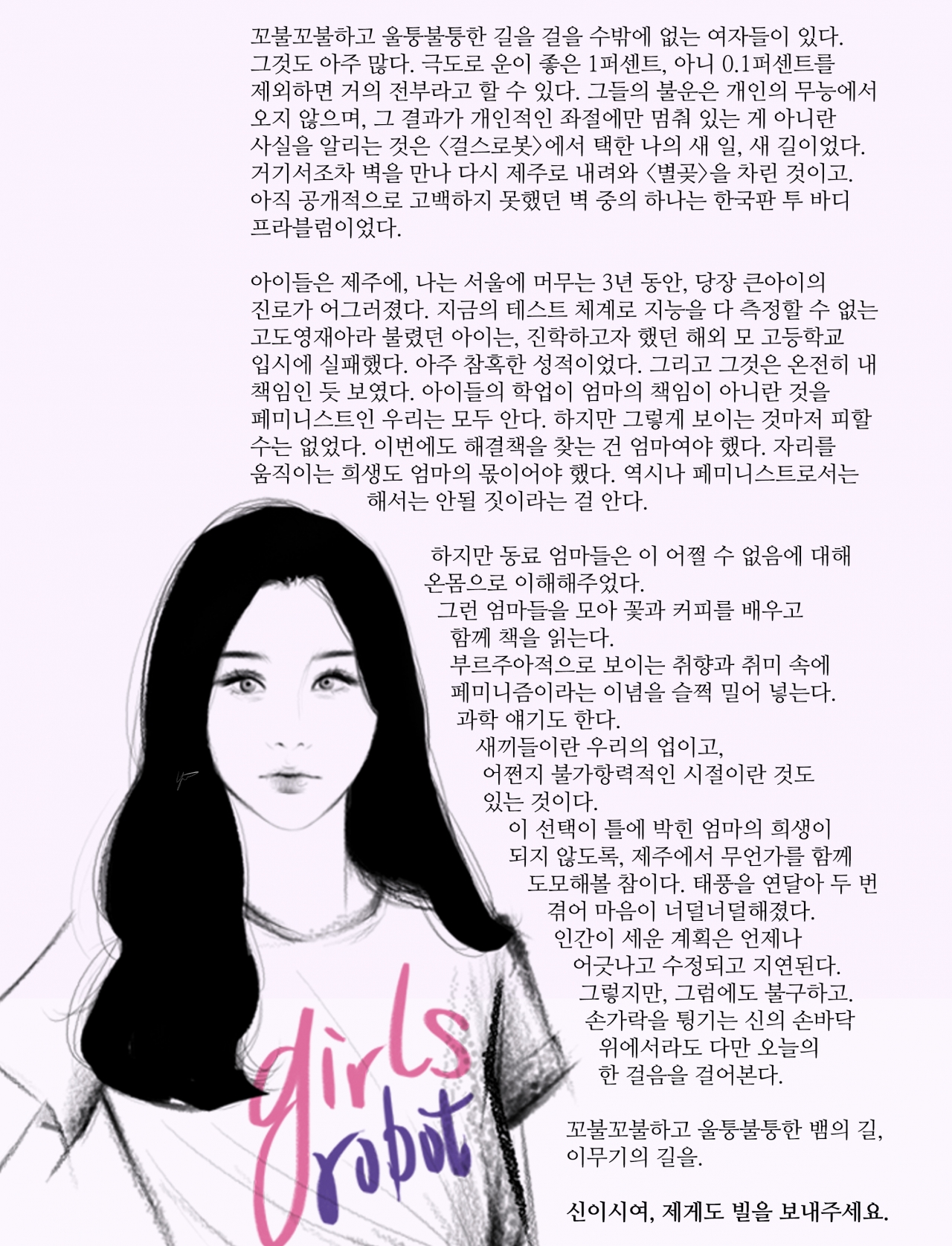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3
제주의 잠 못드는 밤 -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사랑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채는 방법은 어쩌면 간단하다. 누군가 다른 이와 함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난다면, 또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 장면에 견딜 수 없이 샘이 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또 그 일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풀브라이트를 세 번 수상한 여성 식물학자가 쓴 에세이집, <랩걸>의 호프 자렌 교수는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다. 미네소타 오스틴대 과학 분야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공부를 잘하며 자랐다. 순탄하게 학위를 마치고 스물여섯 살에 조지아텍 교수가 됐다. 그에게는 우등졸업을 할 만큼 똑똑하지만 큰 야망이 없는 친구 빌이 있었다. 빌은 동료 테크니션이자 평생의 친구로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며 그를 도왔다. 거기 더해 호프 자렌 교수는 서른두 살에 ‘자신이 지금까지 봤던 사람들 중 가장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 열렬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 남편은 만날 당시에는 학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곧 존스홉킨스의 교수가 된 실력자였다. 그들은 아이들을 낳고 개와 말을 키우며 산다. 자렌 교수는 여러 번 수상하며 학문적으로도 인정받았다. 잘 태어나고 잘 만나고 잘 견디며 이룩한 그의 ‘평탄하고 직선적인’ 삶 앞에서 나는 질투를 느꼈다. 그는 똑바로 걸었다. 그의 길은 평평하고 곧아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명백한 질투였다. 지난해 그 책은 학계와 스타트업계의 여자들 사이에서 거의 하나의 현상이었다. 여자들은 인생의 책, 올해의 책으로 주저없이 랩걸을 들었다. 식물학자의 책답게 표지에는 장식적인 식물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 예쁜 책을 들고 휘리릭 살펴보다 문제의 감정을 먼저 느낀 것이다. 화자가 공부하는 집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순조롭게 교수가 됐다는 프로필은 이미 알고 있었다. 트리거는 공부하는 남편과 고요하게 책을 읽는 장면이었다. 나는 일찌감치 학교를 떠나 조용히 책을 읽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공부를 잘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는 가족들은 내게 없었다. 외모와 성격, 문장, 머리, 취향, 내게 많은 것을 물려주신 아빠는 당신의 세계에서는 인텔리였지만, 학계의 엘리트는 아니었다. 남편도 전문직업인이기는 했지만,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다. 단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장면일 뿐이었는데도, 어디 말할 수 없는 맹렬한 질투심과 절망감을 동시에 품게 됐다. 내가 아는 모든 여자들이 그 책을 칭송할 때, 선뜻 합류할 수 없는 마음은 외로웠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출판사 대표에게 고백했다. 두 번을 샀지만, 아직 읽지 못했노라고.
그는 웃으며 물었다. “빌이 등장하는 장면은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평생의 친구이자 동료에요. 보시면 더 화나실 거에요.” –남편 말고요? “네, 남편보다 낫죠.” 일년이 지난 지금, 제주에서 여성 천문학자 황정아 박사를 초대한 여학생 대상 강연을 기획하면서, 더 이상 피하지 못하고 읽고 말았다. ‘공부의 가치를 알려주고 딸의 능력을 인정하며 학계로 가이드한 교수 아빠’의 존재에 이어, ‘비슷한 분야에서 함께 공부하고 아내의 일을 방해하지 않는 교수 남편’의 존재 못지 않게, ‘곁에서 연구를 도와주는 평생의 조력자 남자사람친구’의 존재는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의 시샘을 불러일으켰다. 이 불가능한 조합들이 말이 된다는 말인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일렬로 서 있을 때나 가능한 행운이었다. 아무리 천재로 태어났어도 공부를 삶의 방식으로 삼고 그 길을 쭉 걷는다는 건, 한 여자에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나는 알았다. 적어도 나는 알았다.
다 읽고 나서 대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빌이 너무 샘이 나서 미칠 것 같네요. 대표가 절망과 웃음이 섞인 답을 보내왔다. “그래서 저도 다 읽고 빌었잖아요. 저한테도 빌을 보내달라고.” 책 사진과 함께 올린 짧은 포스팅에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여성 과학자 문성실 박사가 댓글을 달았다. “남편도 그냥 공부하는 남편 정도가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 원하는 곳으로 아내와 가족을 다 데려갈 수 있는 남편이죠.” 찾아보니 과연 그랬다. 존스홉킨스 대학으로 함께 움직여 ‘투 바디 프라블럼(학교와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를 비롯한 가족이 미국 동부와 서부처럼 멀리 떨어져 사는 문제. 대개는 여성이 직업과 직장을 희생한다.)’을 미연에 막은 능력자였다. 인생의 잔가지를 쳐내고 실험실에서 젊은 날을 불태운 본인의 헌신을 폄훼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식물의 삶을 엮은 아름다운 문장들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행운은 남다른 것이었다. 그 점을 가리고 “나는 노오오오력했다”고만 서술해서는 드러나지 않는 삶의 진실들이 너무 많았다. 적어도 우리 빌, 자렌 교수에게는 우정이었겠지만, 누가 보아도 빌은 그를 사랑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것이었다. 보통은 여자들이 선택하는 사랑의 방식이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어쩔 수 없이 나의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인생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꼭 울게 된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겨우 잠들었다 일어났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사진 한 장 실려있지 않는 책을 덮고, 구글에 그들의 이름을 넣고 검색한 것이다. 짐작한 바와 같이 자렌 교수는 금발의 미인이었다. 남편도 빌도 나무랄 데 없는 백인 훈남들이었다. 남편과 정답게 주고 받은 트윗들과, 빌과 함께 연구실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나는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그것은 질투의 영역에서도 아주 많이 벗어나 있었다.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여자들이 있다. 그것도 아주 많다. 극도로 운이 좋은 1퍼센트, 아니 0.1퍼센트를 제외하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불운은 개인의 무능에서 오지 않으며, 그 결과가 개인적인 좌절에만 멈춰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을 알리는 것은 <걸스로봇>에서 택한 나의 새 일, 새 길이었다. 거기서조차 벽을 만나 다시 제주로 내려와 <별곶>을 차린 것이고. 아직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벽 중의 하나는 한국판 투 바디 프라블럼이었다.
아이들은 제주에, 나는 서울에 머무는 3년 동안, 당장 큰아이의 진로가 어그러졌다. 지금의 테스트 체계로 지능을 다 측정할 수 없는 고도영재아라 불렸던 아이는, 진학하고자 했던 해외 모 고등학교 입시에 실패했다. 아주 참혹한 성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내 책임인 듯 보였다. 아이들의 학업이 엄마의 책임이 아니란 것을 페미니스트인 우리는 모두 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마저 피할 수는 없었다. 이번에도 해결책을 찾는 건 엄마여야 했다. 자리를 움직이는 희생도 엄마의 몫이어야 했다. 역시나 페미니스트로서는 해서는 안될 짓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동료 엄마들은 이 어쩔 수 없음에 대해 온몸으로 이해해주었다. 그런 엄마들을 모아 꽃과 커피를 배우고 함께 책을 읽는다. 부르주아적으로 보이는 취향과 취미 속에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을 슬쩍 밀어 넣는다. 과학 얘기도 한다. 새끼들이란 우리의 업이고, 어쩐지 불가항력적인 시절이란 것도 있는 것이다. 이 선택이 틀에 박힌 엄마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제주에서 무언가를 함께 도모해볼 참이다. 태풍을 연달아 두 번 겪어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언제나 어긋나고 수정되고 지연된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을 튕기는 신의 손바닥 위에서라도 다만 오늘의 한 걸음을 걸어본다.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뱀의 길, 이무기의 길을. 신이시여, 제게도 빌을 보내주세요.
-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2.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 걸스로봇 이야기
-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법률이 너무해
- "페북 싱글사인온 안전하지 않다"
- 신세계I&C, IT기술 활용 사회적경제 기업 4팀 지원
- “내가 검색한 15명, 그들의 마지막 체크아웃 위치 10곳까지 해킹”
- 예술위-올림푸스한국 MOU, 지역 노인 ‘장수사진’ 촬영
- [김재춘의 사회혁신 솔루션] 3. ‘문제 해결 생태계’에 새로움?다양성이 필요하다
- [손종수의 생각의풍경] 시(詩) 좀 쉽게 쓰자고요
- [기자수첩] 당신은 어떤 여행자인가요?
-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4. 로컬에서 나비꿈을 꾸는 사람들, 로컬 이노베이터
-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5. 스카이 캐슬 사람들
-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6. 동지를 찾아서
-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9. 로봇과 여성: 소프트로봇계의 여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