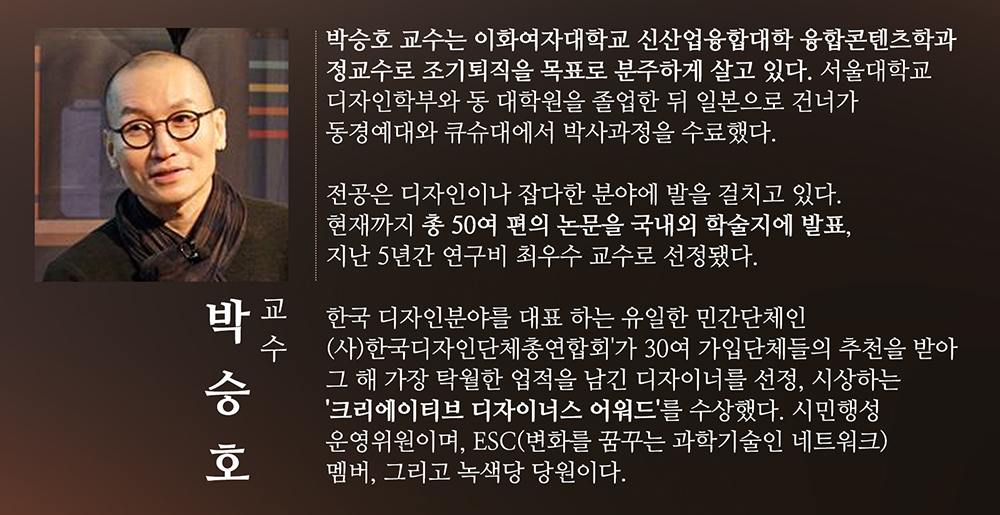아내와 나는 동갑이고 캠퍼스 커플이었다. 그러나 졸업한 뒤 반년 만에 헤어졌다. 대학원으로 진학한 나와는 달리 집사람은 대기업에 취업했다. 사회생활을 하던 그녀의 눈에 공부한답시고 여전히 부모에게 얹혀살며 장난이나 치고 있던 남자친구는 얼마나 한심하고 불안해 보였겠는가. 헤어져 있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익숙해진 관계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집사람 이외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2년 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만나 결혼을 했다.
우리는 본가의 2층에 신혼살림을 꾸렸다. 2층에는 우리 침실과 내 서재 그리고 여동생이 쓰는 방이 있었다. 업어가도 모르게 잠을 자는 집사람과 바늘 떨어지는 소리에도 깨버리는 내가 커다란 침대 하나를 같이 썼다. 오래가지 못했다. 우리는 결혼 반년 만에 다시 헤어졌다. 나는 요와 이불을 들고 서재에서 일하다 잠들곤 했다.
신혼 초기, 덜컥 아이가 생겼다. 나는 생활비도 못 버는 학생이었고, 아빠 노릇을 할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다. 도망칠 수 있다면 도망치고 싶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관념이 아니라 코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였다.
아이의 움직임이 표범처럼 빠르고 곰처럼 힘있게 엄마 배를 밀어낼 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였다. 현실을 외면하려는 마음과 접촉을 통해 점점 커지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었다. 사랑은 그렇게 익숙한 모습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자리 잡아갔다.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아이를 안고 나와 내게 인사를 시켰다. “아빠, 아들이에요.” 우리는 낯설게 시작했지만 볼수록 더 보고 싶은 익숙한 존재가 되었다.
아무리 물고 빨며 사랑했지만, 그런 아들과도 함께 잘 수는 없었다. 나는 바늘 소리에도 깨는 예민한 사람임에 변함이 없었다. 업어가도 모르게 잘 자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잤다. 나는 늘 혼자 잤다. 몇 년 전 청년이 된 아이와 둘이 떠난 해외여행에서도 독방 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익숙함에 둘러싸여 안락함으로 보호받던 내가 최근 들어 변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이화여대 평생교육 단과대학(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일련의 저항들에 자식 같은 우리 학과 신입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자 방관자였던 내게 낯선 감정이 들어섰다. 낯선 학과의 선생들과 연대하였고, 천을 사다가 밤새 초록색 목도리를 만들어 시위대의 목에 두르게 하였다. 결국 총장은 사퇴하였다. 그러나 결기는 식지 않고 광화문으로 주말마다 이어졌다. 나는 변해갔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가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게 못마땅했다. 무엇 때문일까 아이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변해야 할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아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조만간 교수직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큰 변화였다.
집을 짓고 이사를 하면서 큰 서재를 만들고 싶어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한방에서 잠을 자기로 한 것도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랑 한방에서 자니까 깊이 더 잘 잔 거 같아.” 이사로 인해 피곤해서인지 나도 깊이 잘 잤다고 했다.
아침밥을 차리는 아내를 보며 곰곰이 생각했다. 성격상 아내는 자기 때문에 내가 잠을 뒤척이지는 않았을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아이를 데리고 자던 신혼 초기에는 아이 울음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고, 일찍 부모님을 여읜 아내가 시부모가 아무리 친부모 같다고 말해도 모시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아내는 모든 것에 익숙한 것처럼 불편 앞에서 늘 편안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나의 문제에만 천착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아왔던 미숙한 사람이었다. 아내가 요즘 들어 부쩍 많이 하는 말이 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나를 바꿔보려는 나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다. 하지만 낯선 것은 이내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다가서기도 전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