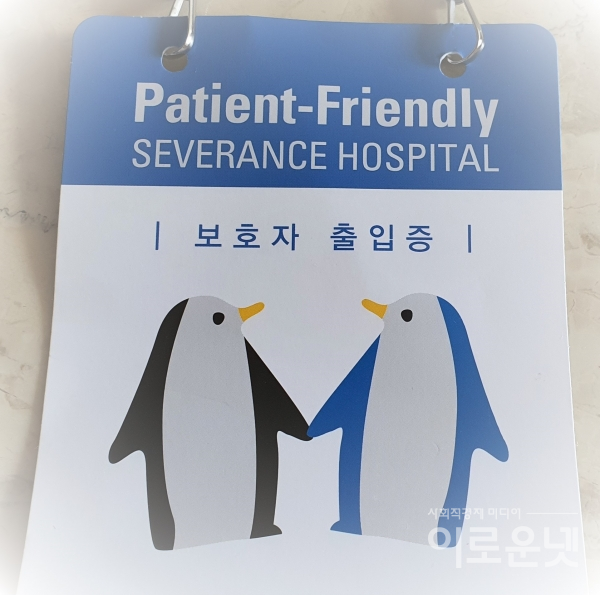
취재원을 만나러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그 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모였다.
“어젯밤 한차례 실신을 했는데 어지럼증이 계속돼. 오늘 아무래도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실신이라니… 응급 상황인지라 모든 걸 취소하고 달려갔다. 그렇게 발을 들여놓게 된 이후 약 일주일 동안 나의 일상은 만 76세 노인의 돌봄에 초점이 맞춰졌다. X레이를 시작으로 심전도, MRI, 심장 초음파, 홀터 검사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주말에 동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 응급시술이 필요해요. 빨리 입원하세요. ”
큰 병원으로 옮기려는 데 토요일 오후라 전화 예약이 안됐다. 다시 이모집으로 달려갔다. 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진료 예약을 마쳤다.
이모는 그 시대엔 드물게 대학교육을 받았고 YWCA에서 여성 운동을 한 분이지만 문자와 카톡을 주고받는 수준의 디지털 지식으로선 온라인 시대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남편도 있고 장성한 두 아들도 있지만 남편은 올해 팔순을 맞이하는 거동이 불편한 심장병 환자이고 아들 둘은 현재 해외 체류 중이라 혼자 사는 노인이나 다름없는 처지다. 어쩌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일 수도 있다. 본인이 실신하기 전까지는 남편 수발을 도맡아 했으니 말이다.
코로나19로 삼성병원에 문제가 생기자 이른바 다른 빅5 병원들은 환자들로 넘쳐났다.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 당일 입원실이 없어 시술을 받지 못했다. 돌려보내며 의사가 당부했다.
“밤중에라도 힘들어하시면 바로 응급실로 모시고 오세요. 지금은 그 방법밖엔 없네요.”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귀가한 다음 날 이른 아침, 당일 입원실을 통해 인공 심박동기 삽입 시술을 마쳤다. 그리고 입원실이 나기를 기다렸다.
당일 입원실은 응급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입원실이 나기 전까지 잠시 머무는 공간이다.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려면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자녀들이 함께 머문다. 난 직계가족이 아니어서 의사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커튼이 드리워진 옆 병상에는 제주도에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 할아버지가 계셨다. 보호자는 당신만큼이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할머니였다. 지금껏 곁을 지키다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변이 마려웠던 할아버지는 간호사를 급히 불렀다.
“의사 선생님이 소변을 참으면 안 된다 했는데 ..”
“예, 할아버지 제가 소변통 갖다 드릴게요”
시술 후 4시간 동안 지혈을 위해 한 쪽 다리를 움직이면 안 됐던 할아버지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변을 눴다. 그리곤 이렇게 조용히 말했다.
“ 미안해요... 간호사님”
손녀뻘 되는 앳된 간호사 앞에서 소변을 보는 게 민망하고 미안했던 모양이었다. 그러고는 “ 아니 이 할망구는 도대체 어디를 간 거야? ”라는 말로 어색한 상황을 얼버무렸다. 이때 내 머릿속엔 남성 환자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간병과 간호분야에 보다 많은 남성들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퍼뜩 스쳐갔다.

오랜만에 찾은 대형병원의 시스템은 자동화 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접수 번호표 뽑기부터 진료 기록 복사, 주차 정산, 수술 진행 상황 조회, 진료비 조회와 정산, 푸드코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 자동화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 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편한 시스템이었지만 대다수 노인 환자와 그 배우자들에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숙제였다.
이모는 시술 후 간병인의 도움을 받았다. 나 역시 일과 가정이 있는지라 24시간 병상을 지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상주 보호자 1명 이외엔 병실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됐다. 문병은 아예 금지됐고 간병인을 둔 보호자조차 동시에 있을 수 없어 서로 교대로 병실을 지켜야 했다.
병상을 지키는 동안 난 이모의 병원 생활을 사진으로 담아 카톡으로 미국과 일본에 체류 중인 사촌 동생들에게 보내줬다. 식사를 잘 안 하시려 들면 “아들과 손주들 기분 좋게 싹 비우시라” 하면 “그래야지” 하면서 잔반 없이 그릇을 싹싹 비웠다. 애들은 이 같은 엄마의 노력에 응원의 메시지와 사진들로 화답했다.
인공 심박동기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두어 달 동안 무리한 팔 동작을 하면 안 되는데 끼니와 청소, 빨래 문제 등은 퇴원을 앞둔 이모에겐 큰 고민거리였다. 내가 코디네이터로 나섰다. 미국에 사는 큰며느리에게 잠시 귀국해 한 달 동안만 노친네들을 돌봐 줄 것을 부탁했다. 아직 애들이 어려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둘째 아들 내외에겐 형수가 14일간 자가격리되는 동안 인터넷 장보기와 먹거리 배송을 맡아 줄 것을 부탁했다.
2박 3일이 지나 퇴원 한 다음날 아침 이모에게서 카톡이 왔다.
“잠 잘 자고 아침 먹고 약도 먹었어. 너 덕분에 내가 살았어! 넘 고맙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이번처럼 가슴에 와닿은 적이 없다.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있어도 몸이 불편하거나 물리적인 거리로 위급한 상황에 돌봐 줄 사람이 없다면 독거노인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독사가 꼭 혼자가 된 노인만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느린 학습자들과 그보다 더 많은 IT 문맹 수준의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과 상대적 젊은이들의 손길이 절실하다. 초연결 시대에 걸맞게 이젠 새로운 공동체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 코로나19로 드러난 사회문제, 소셜벤처가 해결한다면?
-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여러분이 뉴노멀입니다!
- [알면 the 이로운 건강] 36. 차별 없이 진료받을 환자의 권리
- [주수원의 문화로 읽는 사회적경제] 5.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의료사협을 떠올리며
- "AI스피커 매일 사용해요" SKT 노인돌봄 ‘사회안전망’으로 진화
- 복지 생태계를 구현하는 M커뮤니티
- [백선기의 세상읽기]19. 특별한 날을 더욱 행복하게 기억하는 방법
- "연대와 응원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 [백선기의 세상읽기] 17. 코로나19, 비로소 보이는 것들
- 시니어 IT기업 에버영코리아, '줌' 이용 3분 체조로 활기
- [은밀한 호떡집] 6. 그냥 나로 살아요
- [영상] 돌봄인형 반려로봇 '부모사랑 효돌'을 아시나요?
- 오디오가이, 코로나19 의료진을 응원하는 특별 연주회 개최
- 휴먼인러브, 광주지역 취약계층 노인에 식료품 지원
- 코로나19로 드러난 차별과 혐오…영화 9편 통해 들여다보기
- [백선기의 세상읽기] 23. 포인트로 통신비 결제하면 안 될까요?
- [공감인터뷰] 슬기로운 ‘빚 탈출법’을 공개합니다.
- 선병원, 국립한밭대학교와 지역사회 보건향상 협력 맞손
- ‘운동’과 ‘말동무’가 빚어낸 아름다운 변화… 건강복지라이더
- [백선기의 세상읽기] 35. 노인 혼자 대형병원 가기 힘든 세상 어찌할꼬
- [공감 인터뷰] 나는 부모나 형제를 외면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