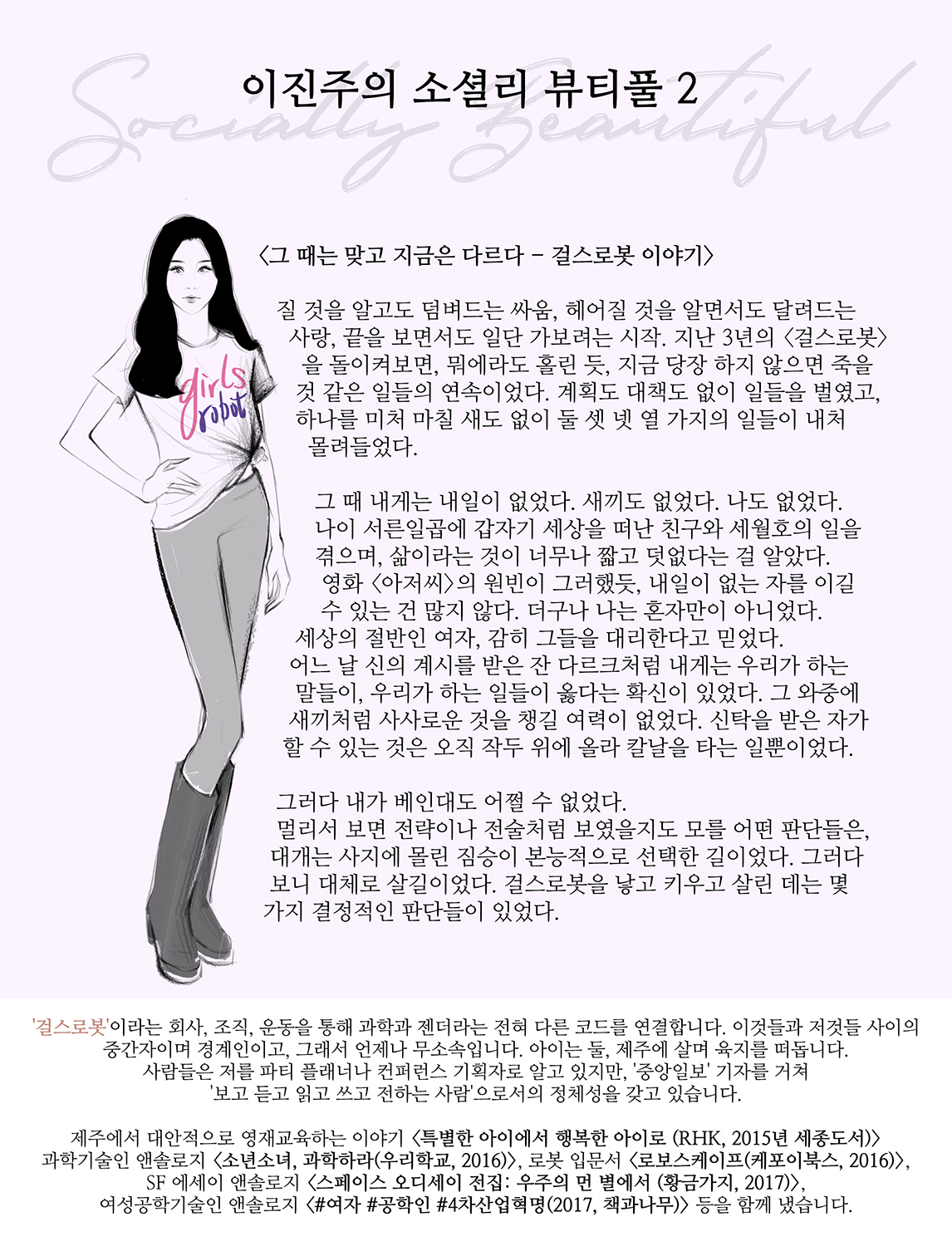

이진주의 소셜리 뷰티풀 2
그 때는 맞고 지금은 다르다 - 걸스로봇 이야기
질 것을 알고도 덤벼드는 싸움,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달려드는 사랑, 끝을 보면서도 일단 가보려는 시작. 지난 3년의 <걸스로봇>을 돌이켜보면, 뭐에라도 홀린 듯,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계획도 대책도 없이 일들을 벌였고, 하나를 미처 마칠 새도 없이 둘 셋 넷 열 가지의 일들이 내처 몰려들었다.
그 때 내게는 내일이 없었다. 새끼도 없었다. 나도 없었다. 나이 서른일곱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친구와 세월호의 일을 겪으며,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짧고 덧없다는 걸 알았다. 영화 <아저씨>의 원빈이 그러했듯, 내일이 없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더구나 나는 혼자만이 아니었다. 세상의 절반인 여자, 감히 그들을 대리한다고 믿었다. 어느 날 신의 계시를 받은 잔 다르크처럼 내게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 와중에 새끼처럼 사사로운 것을 챙길 여력이 없었다. 신탁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작두 위에 올라 칼날을 타는 일뿐이었다. 그러다 내가 베인대도 어쩔 수 없었다.
멀리서 보면 전략이나 전술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어떤 판단들은, 대개는 사지에 몰린 짐승이 본능적으로 선택한 길이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살길이었다. 걸스로봇을 낳고 키우고 살린 데는 몇 가지 결정적인 판단들이 있었다.
첫째, 다시 이과를 선택한 것. 십오 년 전, 이과와 문과를 갈랐던 결정적인 분기점이 있었다. 과학고에 가지 않았던 일이었다. 고백하자면 나는 지금껏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어쩌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학생회장을 하며 실컷 놀다 원서를 써볼까 고민할 무렵, 담임 선생님은 엄마를 불렀다. “쟤 지금 딱 이쁘고 성격도 좋은데, 과학고 보내 이상한 여자애 만들고 싶으세요?” 엄마는 설득 당했다.
그리고 공대에 갔다. 거기서는 작은 미투를 만났다. “나는 남자로 어때?”라는 조교의 고백을 거절하고, 물리학 실험에 B를 받은 일이었다. 올림피아드까지는 시도해본 적 없지만, 서울시 물리경시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받았다. 출석도 실험도 과제도 태도도 나쁘지 않았다. 물증이 없는 보복이었다. 반수를 거쳐 문과로 옮기고, 문과와 이과가 촌스럽게 분리된 세상에서, 쭉 “문송합니다~”로 살았다. 머릿속에 나침반과 시계와 설계도가 없는 해맑은 영혼처럼 굴었다.
세상을 움직이는 언어가 숫자로 이뤄진 걸 눈치 챈 건, 8할은 나의 ‘과학영재’ 친구들 덕분이었다. 그리고 2할은 기자생활에서 얻은 촉.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그걸 중심으로 이과 전 분야, 요즘 말로 STEM을 걸스로봇의 놀이터이자 운동장으로 선택한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었다. 다른 평행우주 속에 사는 소녀가 가르쳐준 일일지도 몰랐다.
둘째, ‘갑’의 지위를 표방한 것.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갑과 을의 포지셔닝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 나는 나와 걸스 친구들의 명예와 안전을 위해 갑이라는 포지셔닝을 선택했다. 여기서 갑이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돈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자체 프로젝트를 만들고 돈을 쓰는 위치를 말한다. 나는 기존의 중간자, 경계인, 거간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꽃뱀’이나 로비스트와 달리 좁은 시장, 작은 파이를 나눠먹을 생각이 전혀 없음을 천명하고, 대신 ‘STEM 분야 다양성 증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웠다. 또한 사비를 퍼부어 팬시한 파티를 열고 기깔난 기획을 하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나는 마케팅 비용을 선 집행했다. 푼돈을 버는 대신 목돈을 쓰는 방식으로, 존경과 명성과 영향력을 얻는 길을 선택했다. 걸스로봇이라는 브랜드는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다 관련 단체 내 성폭력 사건을 겪었다. 내게 의탁해 온 피해자를 돕고, 가해자를 응징하며, 시스템을 개편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깨달으면서 조직과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나와 조직의 ‘교수 아님’, ‘학교 아님’을 절감하며, 이 조직, 운동, 회사의 모호성을 다시금 들여다보게 됐다.
마침 남편의 무조건적인 지원도 끊겼다. 내가 재벌 당사자거나 마누라거나 딸이 아닌 이상, 내 돈을 쓰는 일에는 과연 끝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는 회사의 이름을 걸고 비영리의 일을 했다. 밀레니얼 여대생들을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 일했지만, 그들을 볼모로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란 점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그러나 조직이 영속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또한 이 땅에선 돈을 버는 데 정의 같은 건 아직 필요하지 않았다. 진짜일 필요도 없었다. 그걸 확인하는 일은 씁쓸했다. 사회적 뭐뭐를 꿈꾸는 이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슬픔일 것이다.
한편, 돈을 낸다는 건 조직원이 된다는 의미였다. 선의와 응원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기꺼이 지갑을 열어야 한 편이었다. 의병 노릇에도 돈은 필요하니까. 비영리의 일을 하고 싶다면, 느림과 답답함을 참고 비영리 조직의 룰을 따라야 했다. 그걸 배우는 데 3년이 걸렸다. 그 3년은 또한 내게 몸이 있고, 새끼가 있고, 내일이 있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다. 장학금 1천만 원의 걸스로봇-조경현 펠로우십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활동을 잠정중단하고, 3주년을 앞두고 조직의 형태를 비영리로 바꾸는 작업에 남은 계절을 쓰기로 했다. 또한 다시 제주로, 내가 아는 사람들과 내가 아는 커뮤니티와 내가 아는 시장으로 돌아왔다. ‘여성의 과학’을 더 잘 하기 위해 ‘대중의 과학’을 먼저. 나와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과 엄마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대의명분의 큰 획을 긋느라 벌어진 사소한 틈들을 메우면서.

